-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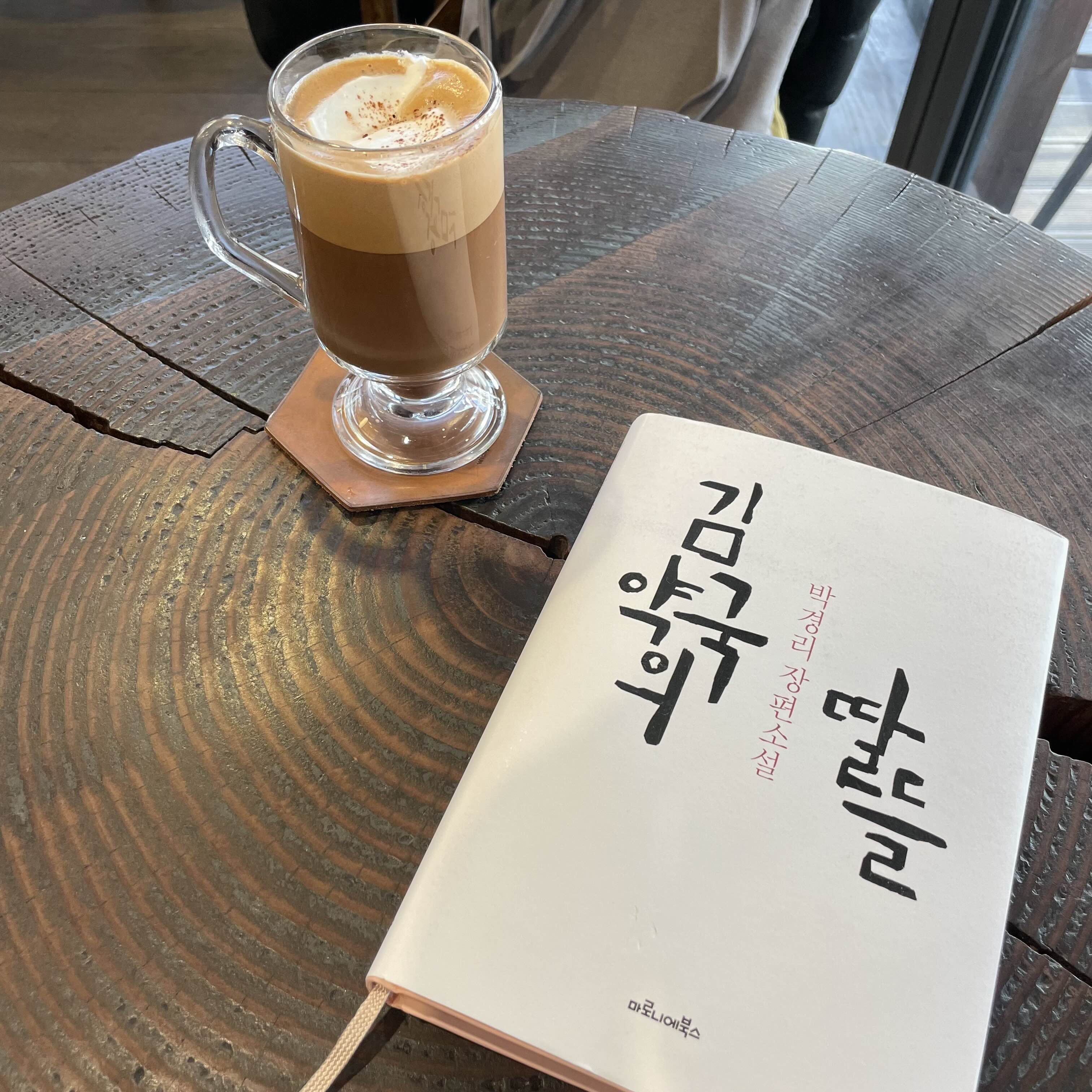
김약국의 딸들/박경리/마로니에북스 하루종일 어두침침하고 기분이 영 가라앉는 날씨다. 요 근래 무슨 생각에서인지 박경리의 『김약국의 딸들』을 집어들었다. 무거운 사회과학 서적이나 인문 서적은 좀처럼 구미가 당기지 않는다. 한편 최근에는 자기 전에 최승자 시인의 시집을 끄적이면서 자주 접하지 않았던 시(詩)를 끄적이기도 했다. 늘 그렇듯 내 독서에는 대중이 없지만, 한국소설을, 그것도 근대 소설을 찾는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다. 처음에는 통영 사투리와 토속적인 어휘가 등장해서 눈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일단 문장이 익자 술술 계속 읽게 된다. 중학교 때 읽었던 해리 포터 시리즈 이후로 뒷이야기를 궁금해하며 몰두해 읽기는 오랜만인 것 같다.
『김약국의 딸들』은 내가 읽은 박경리의 첫 작품이기도 하다. 작가가 평소 어떤 세계관을 그려왔는지에 대한 선입견 없이, 작가가 그려내는 개인과 사회를 오롯이 들여다보고자 하였다.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격랑, 유교 문화의 해체와 서구 문명의 유입, 자본주의의 대두와 같이 여러 거시적 요소들이 소설 속에 다뤄지고 있으나, 내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운명 또는 의지'에 관한 부분이다. 소설 속에서 김약국의 다섯 딸들은 모두 기구한 팔자를 살지만, 둘째 딸 용빈의 경우에는 자신에게 닥친 운명적 시련을 개인 의지를 통해 극복해보려는 모습이 보인다. 김약국 딸들의 기구한 팔자는 잘못된 인연, 외세로부터 부자유한 상황, 시대에 대한 판단착오 등 여러 외부적 요인에서 기인하며, 여기에는 뒤숭숭한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도깨비집' 내러티브가 가미된다.
글쎄 '운명'의 반대말로 '(개인) 의지'를 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등장인물에 따라서 그 개념을 인식하는 관점이 상이하기도 하다. 가령 작중에서 정윤이라는 인물은 독립운동에 뛰어든 태윤에게 '사회보다는 개인이 우선이며, 위대한 목표보다는 개인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미있다'고 역설한다. (pp.205~208) 이러한 정윤의 생각은 매우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지만 한편으로 체념적이기도 하다. 반면 김약국의 둘째 딸 용빈에게서는 '개인'에 대한 또 다른 관점을 도출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용빈은 가세가 기울어가는 가운데에서 삶을 회의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한다. 작품의 후반부에서 로맨티스트이자 혁명을 꿈꾸는 강극(姜極)과 조금씩 공명하는 모습은 '개인'과 '의지'의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보게 한다.
『김약국의 딸들』에서는 죽음을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한다. 심지어 김약국의 부인인 한실댁이 무당을 불러 가假장례식을 치르는 장면도 있다. 앞서 언급했던 정윤은 의사(醫師)이면서 일상적으로 죽음을 목격해왔고, 죽음 앞에서 우리 인간은 운명공동체라는 결론에 이른다. (최승자 시인은 이를 '삶은 공포라는 꽃수레에 실려가는 것'이라고도 묘사했다.) 온갖 종류의 죽음과 광기(狂氣)를 목격한 용빈으로서도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죽음이라는 선(線)과 삶이라는 점(点). 점은 물리적인 공간에서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고 존재한다고 할 수도 있다. 어쨌든 막내 용혜를 거두는 용빈은 그 미미한 존재 가능성을 믿어보기로 하는 것 같다.
책을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지라, 벌써 『토지』도 읽어보려고 알아보고 있다. 요즘 들어서 부쩍 문학을 읽다보면 깊이 공감하는 구절들이 눈에 띈다. 우리의 옛 시대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서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 [끝]

옛 통영시장의 풍경 ‘남아 이십 세, 큰 뜻을 품고 이 길을 내가 가는가. 갈 곳이 있어 내가 이 길을 떠나는가.'
—p. 60
고고한 파초의 모습은 김약국의 모습 같았고, 굳은 등 밑에 움츠리고 들어간 풍뎅이는 김약국의 마음 같았다. 매끄럽고 은은하고 그리고 어두운 빛깔의 풍뎅이 표피, 한실댁은 그 마음 위에 앉았다가 언제나 미끄러지고 마는 것이라 용빈은 생각했다.
—p. 97
“악과 선은 언제나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자신이 악을 악으로 알지 못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여자를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그 여자는 몰라요. 자연 속에서 어떤 생물이 자라나듯 그 여자는 다만 존재해 있을 뿐입니다.”
—p. 120
“허공에 주먹질하고 있다고요? 천만에 말씀입니다. 나는 인간이란 명확한 대상을 향하여 내 젊음을 발산하고 있는 거요. 어째서 인간이 허공이란 말이요?”
—p. 205
“사회의 질서라는 건 실상 나약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완강하기 짝이 없는 거지. 그것은 모두 자연의 흐름이다. 기를 쓰고 덤빌 필요는 없다. 인간의 작의로 된 건 아니니까. 인간은 개인으로 살았고 개인으로 죽었다. 어떤 변혁이 와도 인간은 의연히 개인으로 대처한다. 개인이 질 때도 있다. 그 사회의 변혁이란 역사를 위해서 혹은 어느 집단을 위해서 있었다고 생각지 않아. 개인을 위해, 개인의 생활을 위해 있었다.
—p. 207~208
김약국은 바둑판을 밀어내고 담배를 붙여 물었다. 체념이나 균형을 잃은 자세란 언제나 약속이 된 생명의 가능 속에 있음을 김약국을 깨닫는다. 애정도 없는 여자 집에 발길이 돌아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집착과 미련이지, 그 여자에 대한 집착이나 미련은 아니다. 여자 집으로 가는 것은 허둥대는 어느 상태의 연속에 지나지 못한다.
—p. 301
자기를 위한 성문을 굳게 지켜온 이기적인 김약국이 지금 자기의 육체가 허물어져 가는 마당에서 어떤 마음의 반려자를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애써 지켜온 고독, 그 고독을 즐기기조차 했던 지난날에 비하여 너무나 비참하게 그 고독을 무서워하고 있는 것이다.
……자아 속에서 시름하던 그는 타아他我의 인과를 발견하고 타아를 위하여 헛되게 보낸 세월을 후회하는 것이었다.
—p. 337~338
‘사람이 사는 곳에 외로움이 있다.’
—p. 359
……그 비정상적인 연애 속에서 그들은 일종의 자학을 맛보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맹목적인 사랑에 빠지기에는 너무나 그들 형제는 지성이 승勝했다.
—p. 365
“공간보담 낫지. 시간의 노예가 되는 것은 자유보다 훨씬 덜 피곤하지.”
“다르다는 것은 운명이 아니야. 나는 내 직업상 수없는 인간의 죽음을 보았어. 인간의 운명은 그 죽음이다. 늦거나 빠르거나 인간은 그 공동운명체 속에 있다. 죽음을 바라보는 꼭 같은 눈동자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말자.”
—p. 370~371
“혁명은 로맨티시스트가 이룩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실리자가 장악하는 거죠. 로맨티시스트는 종국에 가서 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로맨티시스트는 또 일어나죠. 어떤 세대의 가름길에서.”
—p. 403
'일상 >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열왕기상・하 (0) 2022.01.11 이 시대의 사랑 (0) 2022.01.09 달과 불(la luna e i falò) (0) 2022.01.01 한 게으른 시인의 이야기 (0) 2021.12.22 백년전쟁(1337~1453) (0)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