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일상/book 2025. 4. 17. 11:33

이 문장은 누구의 것인가/데이비드 벨로스, 알렉상드르 몬터규/이영아 옮김/현암사 저작권의 최근 역사를 개인 자유와 권리의 성장으로 단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에 가까울 것이다. 20세기 후반 저작권법에 생긴 변화는 1604년부터 1914년까지 잉글랜드의 공유지를 거의 다 사유화한 인클로저 법(Acts of Enclosure)에서 이름을 따와 ‘뉴 인클로저(New Enlcosure)’라 불린다.
―p.22
지배적 합의에 어긋나는 저작물에 대해 처벌받음으로써 저작물을 ‘책임지는(own)’ 사람은 당연히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소유할(own)’ 수 있어야 한다. 즉 그 수익을 가져야 한다.
―p.49
지식 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겨난 것은, 창작물의 궁극적 기원에 대한 믿음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의 원천을 개개의 인간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p.62
저작권(copyright)은 복제할 권리를 의미하지 않으며 그런 적도 없다. ‘풍부’를 의미하는 라틴어 ‘copia’에서 유래한 ‘copy’ 또는 ‘copie’는 고문서를 ‘더 채워 넣어’ 아름답게 제작하는 필경사의 작품을 지칭하는 단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copyright’라는 용어가 18세기 초반에 만들어졌을 땐, 텍스트를 인쇄하고 출판할 특권을 지칭할 의도였고 오로지 그런 의미로만 쓰였다.
―p.67
어떤 주장의 타당성을 증명하려면, 그 반대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장려책이 생산적인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장려책이 없었다면 몇몇 중요한 발견을 놓쳤을 거라는, 혹은 저작권이 없었다면 몇몇 가치 있는 문학‧미술‧음악 작품이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p.84
영국의 저작권(copyright)과 프랑스의 저작자의 권리(droit d’auteur)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영국은 ‘학문의 장려책’으로써 제한된 상권을 허가한 반, 디드로는 저작물에 대한 재산권을 상권 이상의 근본적 인권으로 본 것이다.
―p.92
…로마인들은 남에게 모욕당하면 법정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오래된 권리의 일부 측면은 명예훼손법으로 넘어갔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의 저작권법에 속한 인격권은 이런 고대의 권리 소유 개념을 직접 물려받았다.
―p.97
‘revolution’이라는 단어는 행성이나 바퀴나 크랭크를 출발점으로 되돌리는 360도 회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18세기 동안 이 단어는 다른 의미, 즉 ‘사회적‧정치적 질서가 180도만 움직이는 변화’로 쓰이기 시작했다. 저작권법은 이 단어의 후자의 의미인 척 전자의 의미로 쓰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이전 상태로 복귀하면서 방향을 바꾼 척 속여 넘긴다는 것이다.
―p.122
잉글랜드의 앤 여왕 법이 그 목적을 ‘학문의 장려’로 설명했듯, 미국 최초의 저작권법 역시 “지도‧도표‧서적의 저작자 및 저작권자에게 상기한 기간 동안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문을 장려하기 위한 법“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둘 모두 법 조항에 확실히 명시되지 않은 전제를 깔고 있다. 첫째, ‘학문’의 증진이 곧 공익이다. 둘째, 그 창작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얻는다면 공적 자산의 양이 늘어날 것이다. 첫째 전제는 완전히 공리주의적인 관점을 띠고 있으며, 둘째 전제는 작가들이 금전의 유혹에 약하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두 전제는 서로 다르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 3세기 동안 영미법계의 저작권 제정 및 소송은 그 둘을 말과 마차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여겼다.
―p.124
라카날 법은 저작자나 그 상속자 혹은 저작자에게서 텍스트를 양도받은 출판업자에게 사후 10년까지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선동 및 명예훼손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천재 권리 선언’으로서 일정 기간의 저작권이 만들어졌다.
―p.127
1928년에 내려진 이 판결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그 후로 미국의 연예인들은 명예훼손, 상표권 침해, 부정 경쟁, 이미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아마도르 소송을 판례로 삼을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p.150
‘독창성의 문턱’이 낮아지면서, 저작권은 공익에 기여하는 제한된 범위의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서적 출판업을 규젷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다.
―p.155
베른 협약 제4조는 저작권의 보호 범위를 정했다. …제4조의 각주에는, ‘과학 자체’는 그 생산물을 복제하기 쉽지 않으므로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창작자를 보호하는 것과, 새로운 발견, 새로운 사실, 새로운 사상에 깃든 공익을 보호하는 것을 구별하는 전통을 따른 것이다. ‘자연적 진리’는 그것을 발견한 자의 재산이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17~18세기에 여러 번 공표되었고, 21세기 저작권법에도 구두적 근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인쇄 시대에는 사실과 그 표현을 구분 짓기가 꽤 쉬웠지만, 전자 통신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구분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p.176
1866년 독일 통일과 1870~1871년의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후, 자유 무역 기조가 흔들리고 국가 간의 경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저마다 관세 장벽 뒤에 숨어 이익을 꾀하면서, ‘자유로운 접근’을 막고 ‘철저한 보호벽’을 세웠다. 새 발명품은 국가 정체성이 달린 문제가 되었다. 특허법은 국가의 지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다시 등장했다. …당시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사람에게 자연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p.190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시들에 대한 나탈리아의 권리가 소멸한 해에, 푸시킨의 작품들은 163개 이상의 서로 다른 판본으로 출간되어 150만 부 가까이 팔렸다. 문맹률이 여전히 높은 나라에서 실로 대단한 판매 기록이었다. 이는 저작권 보호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장을 억압할 수 있는지 증명해준다.
―p.196
1793년 프랑스에서 사후 저작권 보호 제도가 시작된 것은, 천천히 팔리는 책,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작품, 탈고 직후 사망한 작가의 저작을 출판업자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었다. 러시아에서 그 제도는 사망한 유명 작가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했다. 그런 다음 1886년의 베른 협약을 통해 영국과 기타 유럽 국가도 그 발상을 차츰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50년이라는 보호 기간을 의무가 아닌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사후 저작권 보호의 진정한 수혜자는 개별 창작자나 그들의 사후 남겨진 아내, 자식, 손주, 유산 상속자가 아니라 소설‧노래‧녹음 기록‧영화‧그림‧프로그램의 ‘종신 저작권’을 정기적으로 사들이는 기업들이다.
―p.203
저작권도 추상적 실체일까? 그것을 정의하는 법이 연이어 제정되면서 본질에 대한 설명도 점점 더 완벽하게 다듬어졌을까? 아니면 오히려 그것을 정의하는 법의 총계에 불과할까? 자연법의 산물이 아니라 그저 말의 창작물일까?
―p.216
1909년 개정법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저작권 범위와 영역의 큰 확대가 아니었다. 6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개정법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마치 뒤늦게 덧붙인 듯한 제62조항이다.
업무상 저작물의 경우 ‘저작자’라는 단어에는 고용주가 포함된다.
…법인의 소유권은 부분적으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 개념은 ‘회사의 발명 사용권’이라는 산업계의 오랜 관습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창작물의 소유권이 실질적인 창작자로부터 점차 떨어져 나가면서 오늘날의 저작권 제도는 그 명분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
―p.218~221
‘원저작자’ 자격보다는 신문업자가 기사를 ‘창조’하기 위해 들인 노동과 돈을 저작권으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다.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정신보다는 준산업적 사실 수집 사업에 부여하는 일명 ‘이마의 땀(sweat of the brow)’ 원칙이 영미법에서 우세해졌다.
―p.234
‘형식(forme)’과 ‘내용(fond)’을 구분하여 텍스트를 해석(explication de texte)하는 프랑스의 전통적 공부법처럼 아이디어와 표현을 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 개념은, 두 사람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정확히 똑같은 언어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일반적인 가정에 근거한다. 언어는 지나치게 가변적이고, 유연하고, 대략적이며,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렇듯 무의식적으로 베끼는 현상에 ‘잠복 기억(cryptomnesia)’이라는 용어를 붙였지만, 정신 장애라고 할 수는 없다. 누구나 그런 식으로 언어를 익히지 않던가. 어휘, 표현 방식, 상투적인 문구, 속담 등등을 자기 것으로 습득한 다음 그 출처를 잊는 것이다.
―p.237~238
지난 세기 동안 ‘아이디어’와 ‘표현’ 사이의 불안정한 경계선을 단속하기 위한 판례법이 상당량 생겨났다. 이제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작품을 접한 적이 있고, 피고의 작품과 자기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법에서 말하는 ‘유사성’의 경계는 ‘필수 장면(scene à faire)’이라는 사법 개념에 의해 정해졌다. 18세기 프랑스 연극 비평에서 미국의 법적 소송으로 도입된 ‘필수 장면’은 희곡‧소설‧영화에서 창작이 아닌 장르적 제약 및 기대의 결과로 간주되는 플롯 요소나 상황을 일컫는다..
―p.243~244
건지섬의 초상권법은 ‘인격 뒤에 있는 인물이나 캐릭터(personnage)’와, 등록 주체인 ‘인격’을 구분한다. 자연인, 법인, 공동 인격체, 단체는 물론이고 허구의 인물까지 인격으로 등록될 수 있다.
―p.246~247
곳곳의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두 용어가 있다. 개인의 이미지 및 음성의 공공 이용을 ‘통제’할 권리로 통하는 ‘퍼블리시티권’ 그리고 이와 유사하지만 이름‧주소‧이미지‧음성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사용을 ‘금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 ‘프라이버시권’.. 프랑스에서는 ‘사생활의 권리(droit à la vie privée)’와 ‘초상권(droit à l’image)’으로 거의 같은 취지의 구분이 이루어졌다.
…프라이버시권이 자연법과 사적 권리에서 파생되었다는 시각은 더욱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한다. 저작권법상의 이득은 상속 가능하지만 기한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베른 협약이 인정한 인격권은 사적 권리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기한으로 상속 가능하다.
―p.249~251
프랑스의 인격권은 구체적 법률이 아닌 일련의 사법 판결을 통해 확립되었다. 그 가운데 창작자가 공표된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저작자명으로 명시할 수 있는 성명 표시권(droit de paternité)과, 창작자가 창작물의 훼손‧파괴‧변경을 막을 수 있는 동일성 유지권(droit au repect de l’intégrité de l’œuvre)은 베른 협약에 성문화되었다. 프랑스에는 다른 인격권이 몇 가지 더 있다. 저작자가 저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공표권(droit de divulgation), 출판업자나 라이선스 실시권자(license)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조건으로 권리자가 저작물의 추가 공표 및 배포르 막을 수 있는 원작 철회권(droit de retrait et de repentir), 창작자가 자신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할 권리 긔고 시각 예술가들이 저작무의 재판매에 관여하고 판매액의 일정 몫을 받을 수 있는 추급권(droit de suite) 등이 있다.
―p.2601920년대에 공영 라디오가 등장하면서 음반 시장이 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트랜지스터라디오의 발명에 이어 녹음테이프가 매매되자 음반은 돈을 쓸어 담는 대규모 산업이 되었다.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실제 음악 ‘창작자들’의 재산은 그리 늘지 않았다. 시연자들 역시 그들의 노동은 업무로 취급되었고, 그래서 그들의 권리는 음반 회사에 속해 있었다.
―p.270
현재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여기에 추가되었다. 제10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어문 저작물’은 낱말 숫자 또는 기타 언어적‧수적 기호나 표시로 표현된, 시청각 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이다. 책, 정기 간행물, 원고, 음반, 필름, 테이프, 디스크 혹은 카드 등 저작물이 체화된 물체의 성질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프로그램 컴파일의 조합‧선별‧배열‧편집‧어문적 표현이 독창성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공표 및 등록을 마친 프로그램이 저작권청으로부터 저작권을 인정받은 몇 건의 선례가 이런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우리 삶을 여러모로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독점적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 진정한 전환점이 된 것은 1976년 저작권법이었다. ‘어문 저작물’이라는 짧은 단어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램에 마법을 부린 셈이다.
―p.276~277
1976년부터 미국은 판을 뒤집고 세계를 역습하기 시작했다. 200년 동안 저작권 보호를 미루며 국가 간 규제에 참여하기를 꺼리던 미국이 50년 전 소프트파워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눈을 뜨더니, 임대로 창출이라는 새로운 책략을 다른 국가들에 성공적으로 전파했다.
―p.278
특정한 경우에 저작물의 사용이 공정 이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다음의 요인들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상업용인지 비영리 교육용인지를 포함한, 그 사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권 보호를 받는 저작무의 성격
(3) 해당 저작물 전체에서 사용된 부분의 분량 및 중요성
(4) 이러한 사용이 해당 저작물의 잠재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p.285
상원의원 제임스 엑슨이 발의한 1996년의 통신 품위 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CDA)은 도덕성 검열과 비슷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인터넷의 ‘오물’을 제거하려 했다. …와이든은 인터넷 이용자가 웹에 게시하는 내용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의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특별 조항을 추구하는 데 성공했다. 제230조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삽입되었다. “쌍방향 컴퓨터 서비스의 제공자나 이용자는 다른 정보 콘텐츠 제공자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공표자 또는 발화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이제 소셜 미디어를 포함한 온갖 온라인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는 디지털 미레니엄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으로 이어지는 길을 터주었다.
―p.293~294통신 품위 법은 컴퓨터를 통한 자료 배포를, 지난 5세기 동안 ‘소유’와 ‘책임’이라는 쌍둥이 개념의 균형을 유지시켜준 제약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간주한다.
―p.295
번거로운 절차, ‘공정 이용’의 애매한 기준,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라이선스 취득을 강요하는 보험 회사와 출판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그 비용을 치러야 하는 작가의 부담 등등의 문제로 인용문을 집어넣기보다는 그냥 빼버리는 편이 더 안전하다. 이 때문에 20세기 후반과 21세기의 책에 담기지 못한 내용은 얼마나 많을까? 물론 없는 것을 셀 수는 없지만, 저자의 자발적인 누락이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p.333WYSIWYG는 문서를 작성 중인 이용자에게 최종 결과물에 가까운 것을 보여주는 20세기 워드 프로세서의 약칭이다. ‘현재 화면에서 보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출력 결과를 얻을 수 있다(what yo see is what you get)’는 의미다. 19세기 말부터 영화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실제로 거기 있다고 믿게 만드는 범상한 설득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21세기에 우리가 영화 스크린이나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은 실제로 거기에 ‘없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 대부분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p.337
재현(representation)이 우리 정신을 쥐락펴락하는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재현은, 다른 매체를 거치지 않고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저작권 문제와 간접 광고로 스크린 위에 재현되는 현실 왜곡을, 상투성 짙은 오락물의 사소한 별스러움으로 치부해서는 곤란하다. 판타지와 SF를 일상의 묘사와 구별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하지만 제작비와 저작권법 때문에 극 영화가 현실을 무분별하게 가감하여 묘사한다면, 관객들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없는 것은 셀 수 없다’
…“현실을 기록해야 하는 사람들이 현실을 촬영하기 위해 현실을 체계적으로 바꾸고 있다.”
―p.339~341
미국에서 도를 넘은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변형’을 근거로 한 ‘공정 이용’ 변론이 단골로 등장하게 되었다. 문제는, 변형과 도둑질은 한 끗 차이인지라 판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유의 소송은 예측 불허의 결과가 나올 위험을 피하기 위해 법정 밖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p.345~346
1909년에 ‘저작자’가 ‘고용주’로 1976년에 ‘어문 저작물’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정의되었듯, ‘변형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예술 용어로 변형되었다. 더 이상은 일상대화에서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으며, 저작권료 지불에 관한 다툼에서 그 단어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대법원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p.350
한 시사평론가의 주장에 따르면, 프로그래머들은 “잘 만들어진 작업물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그 작업물을 다운로드하는 이들로부터 인정받는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선물 경제는 사이버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최선의 방식이다.”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노동과 재미가 공산 경제로 합쳐지는 탈노동 사회(post-work society)의 시작으로 보는 평론가도 있다.
―p.353
거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는 보호 수준이 각기 다른 라이선스들을 제공한다. CC-BY는, 저작물을 복제‧재배포‧수정‧개작하는 이용자가 원작자를 밝히기만 하면 된다. CC-SA의 경우, 저작물을 개작하는 자는 추후 그 개작물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원작자 표기를 요구해야 한다. CC-NC는 비영리적 목적의 재배포 및 재사용만 허용한다. CC-ND는 저작물의 개작이나 2차적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들 범주를 다양하게 조합하는 것도 가능하며, 창작자가 저작권을 버리고 저작물을 세계 공유 재산으로 돌릴 수 있는 CC0도 있다.
―p.354
발명가들은 잘 알겠지만 기술 자체는 큰 부를 창출하지 않는다. 그 기술의 소유자를 결정하는 법이, 돈을 쓸어 담으며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법인과 개인을 탄생시킨 것이다.
―p.357~358
19세기 잉글랜드에서, 저작권과 특허권의 적절한 범위를 두고 벌어진 기나긴 다툼은 흔히 ‘머리 좋은 자(men of brains)’와 ‘돈주머니를 찬 자(men of moneybags)’ 간의 줄다리기로 묘사되었다. 150년이 지난 지금, 후자가 우위를 차지하며 모든 갈등을 종식한 듯하다.
―p.36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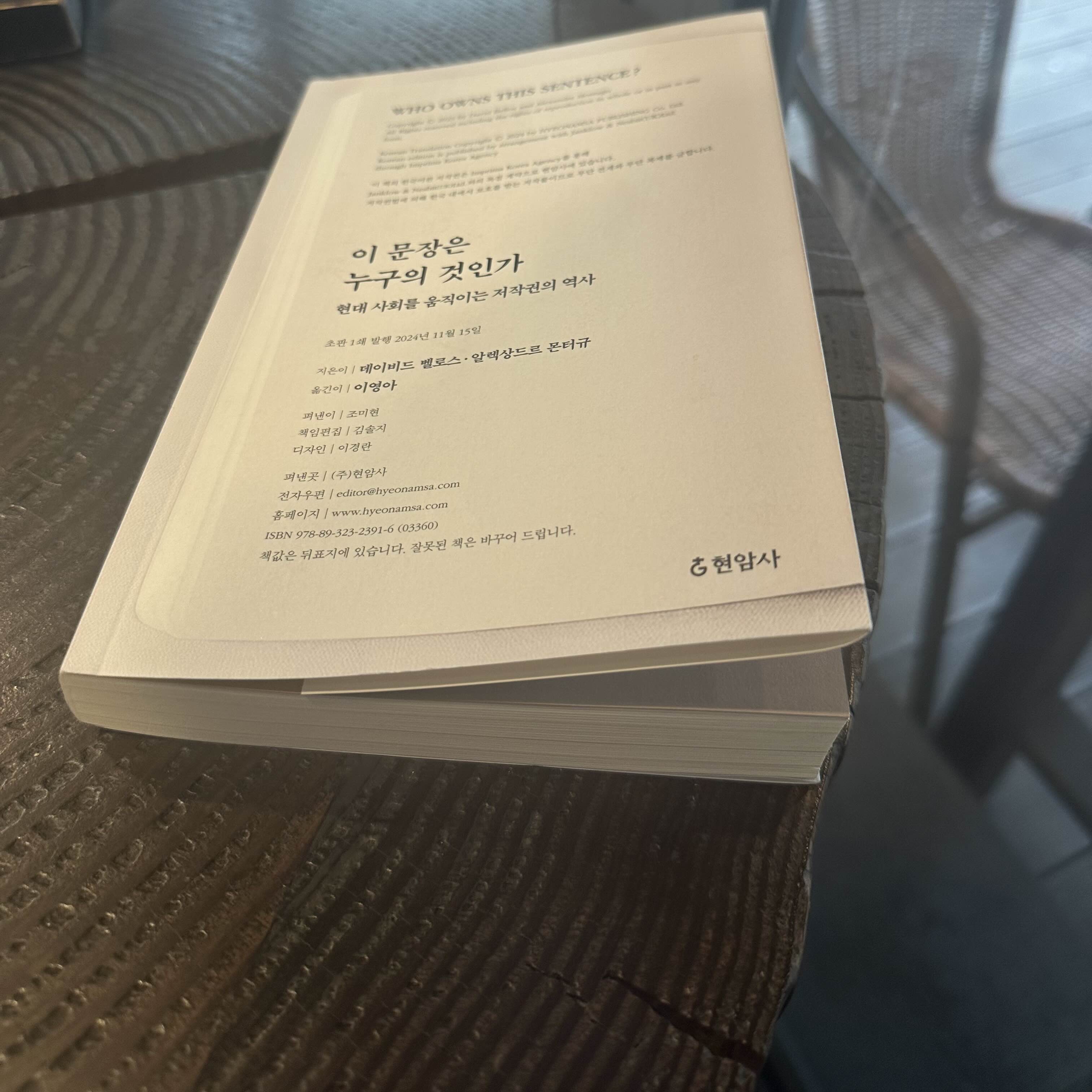
'일상 > book'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의 수명 (0) 2025.05.20 위태로운 삶(Precarious Life) (3) 2025.04.24 몸짓들(Gesten) (0) 2025.04.01 못섬(Motseom) (0) 2025.03.31 바깥은 여름 (0) 2025.03.13